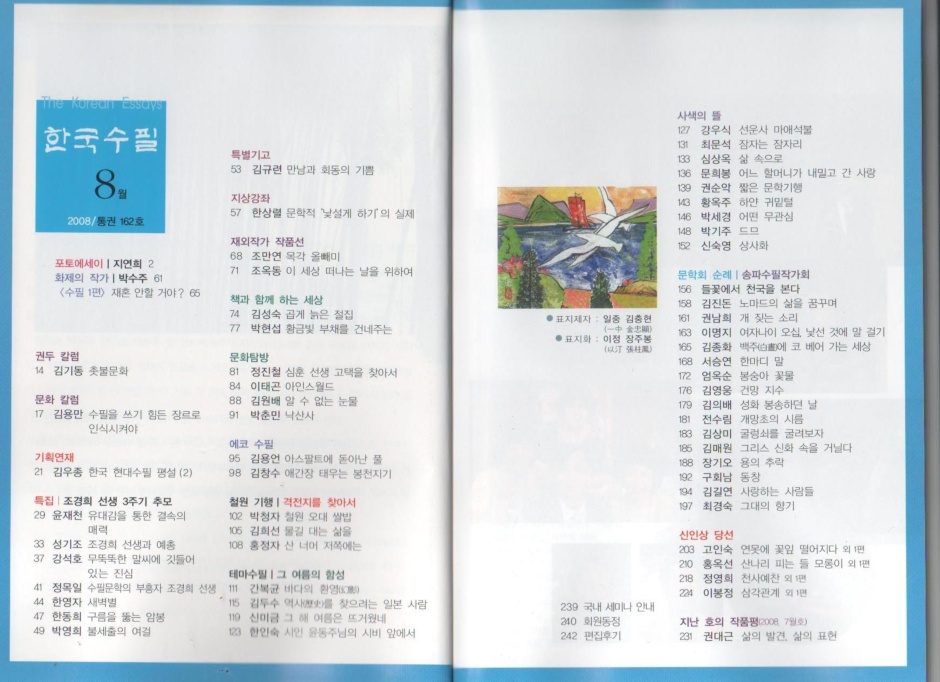발행인 유혜자. 편집주간 권남희. 출판 선우미디어
맵시
2008년 8월호
박 장 원
어느 스타일리스트의 이야기.
“유행하는 스타일마다 다 해봐도 별로 티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언제나 트렌드 리더인 사람이 있다. 같은 옷을 입어도 왜 옷태에 차이가 날까. 옷은 반드시 자신을 먼저 분석한 이후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몇 가지 조건들을 충실히 기억하고 있다면, 나도 옷발 잘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친숙한 소재’, ‘적당한 컬러’, ‘맞는 트렌드’ 그리고 ‘실루엣, 시선의 분할’.
자신의 몸에서도 강조해야 할 부위는 드러내고, 감추어야할 부위는 가리는 시선의 분할이 중요하며, 자신 있는 소재를 선택하고 컬러의 농담을 맞추고 많은 옷을 입어보고 그 느낌을 소화해야 옷맵시가 날렵해진다. ‘자신의 분석’과 ‘자신에게 어울림’에서야 옷발이 선다는 것이다.
속과 겉이, 바탕과 꾸밈이 흠씬 녹아든 어울림은 보기가 좋다.
박세경이 단장한 <어떤 무관심>의 글태가 빛난다.
꿈속이었지만 깨어있는 눌함訥喊이 예리하였다. 군더더기 없는 짜임에서 드러난 효과적인 파헤침이 인상적인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고 무대를 압도한다.
“아니 저건 사람이잖아?”
벌건 대낮 길바닥에서 사람이 사람을 리모콘으로 로봇처럼 조종하면서 조롱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무관심한 관중들에게 ‘사람이잖아.’ 외친다. 아무리 물질만능 시대라지만, 아무리 인명경시 세태라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마구 할 수 없다는 비열한 야유가 아닌 절절한 고발이었다.
“큰 남자는 구경꾼들의 흥미를 위해 겉옷을 벗기고 부라자의 어깨끈까지 풀리게 하며 느물거렸다. 처음에는 너무도 그 동작이 빠르고 정확해 로봇인가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민망해 어쩔 줄 모르는 눈망울과 내비치는 눈물로 로봇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말려야 된다는 생각에 큰 여인 옆으로 가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는 이미 타성에 젖어 이성을 잃은 것 같았고 그 곁의 작은 사내는 큰 남자 앞에 두 손을 비비며 굽신거렸다.”
‘느물’과 ‘굽실’의 상징적인 타락사회 트라우마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환각의 정수리에 여지없이 꽂히고, 폐부에서의 고함이 물컹 터져 나온다.
“아, 코피!”
단조로운 색상. 그 빛은 숙명처럼 느껴지지만, 슬픔을 더욱 선명하게 전해주었다. 이 끈적끈적한 물질에서 휴머니즘의 원형질이 느껴진다. 생뚱맞았다는 꿈속에서의 이야기는 약간은 낯설지만 튀지 않는 서투름으로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했다 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이제는 가버린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아쉬움을 갈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쟁쟁하게 울려 퍼진다.
장기오가 그려낸 <용의 추락>의 실루엣이 평범하다.
어쩌면 수필은 초라한 장르다. 초라하다고 해서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할 곳은 드러내고, 감추어야할 곳은 가리는 시선의 분할이 깔끔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저 붓 가는 대로 심상을 밟다가는 십상 엉켜버린다. 간혹 주위에서 도전적인 운필을 부추기지만, 무심히 거기에 휘말리면 되돌아 나오기 고약한 뻘밭이다.
“되돌아 나올 시간이 없어 하룻밤을 그 고장에서 보냈는데 동네 어른들 모두 다 찾아와 나에게 그를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네 청년들은 그 고장에서 가장 근사한 식당에서 가장 비싼 저녁을 사면서 그들이 그 친구에게 거는 기대가 어떠한지를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댔다. 만약 내가 그 동네에서 촬영을 했더라면 아마 플래카드가 붙고 그의 금의환향으로 인해 온 동네가 한바탕의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수필은 정에서 우러나야 한다.
할큄이든 부딪침이든 축축한 물기가 없다면 스타일은 바삭 메말라버린다.
꿈 많던 후배 연출자의 추락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한다. 할 말을 다하였지만 뒷맛이 없다. 분위기가 사라진 이유는 서정의 농담을 간과했음이다. 순박한 시골 청년들의 응원을 “거품을 물고 떠들어 댔다.”는 언짢은 화룡점정에서 눈초리를 날카롭게 하였다. 아무리 저간의 사정이 그랬어도 다정의 소재를 보듬어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용의 추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문학에서 ‘스타일’ 즉 문체는 작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이나 구성의 특질이며,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 있게 나타내는 데 작용하는 언어적 제반요소의 총체이다.
옷발에 글발을 걸쳐본다, ‘자신에게 어울림’이 아름다운 외관인 형식의 모색이라면 ‘자신의 분석’은 본바탕인 내용의 고찰이다. 패션을 짐작하는 스타일리스트나 문학을 가늠하는 스타일리스트의 탐미적인 감각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옷과 몸의 조화에서 옷발이 선다면, 무늬인 아름다운 외관과 질료인 본바탕의 일치에서 글발이 나는 것이다.
개살구 지레 터진다고 무르익으면 신선도는 떨어지고, 모과가 배를 흉본다고 떫으면 감칠맛이 달아나는 것이다. 때문에 자신을 분석한 후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듯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드러내어야 날렵한 맵시이다.
* 수필가 ․ 평론가
수필집《양수리》, 평론집《현대한국수필론》
'월간 한국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월에 해야할 일(월간 한국수필 5월호 정목일 이사장 발행인 에세이) (0) | 2012.05.03 |
|---|---|
| 월간 한국수필 11월호 (0) | 2008.11.03 |
| 월간 한국수필 9월호 (0) | 2008.10.14 |
| 월간 한국수필 10월호 (0) | 2008.10.07 |
| 2008. 월간 한국수필 2월호 (0) | 2008.02.03 |